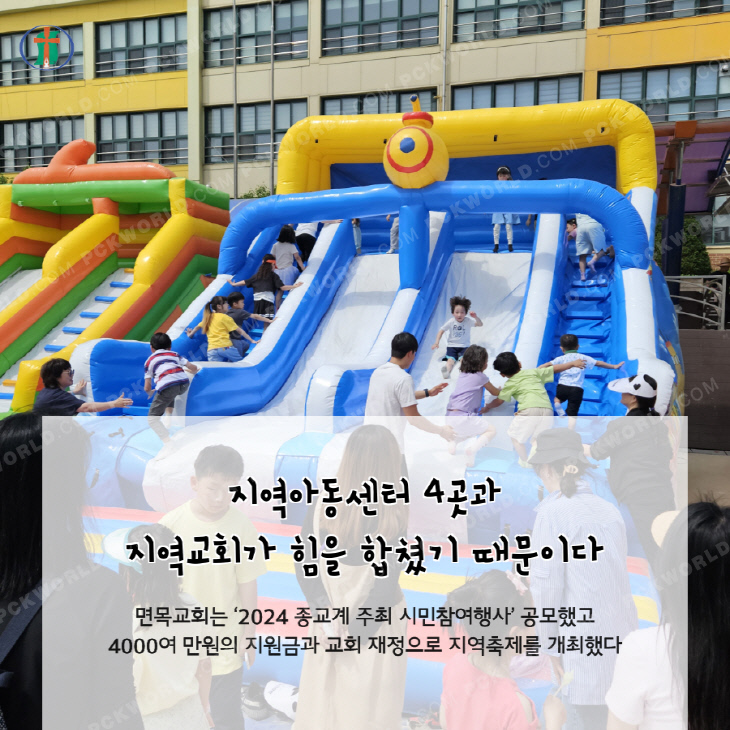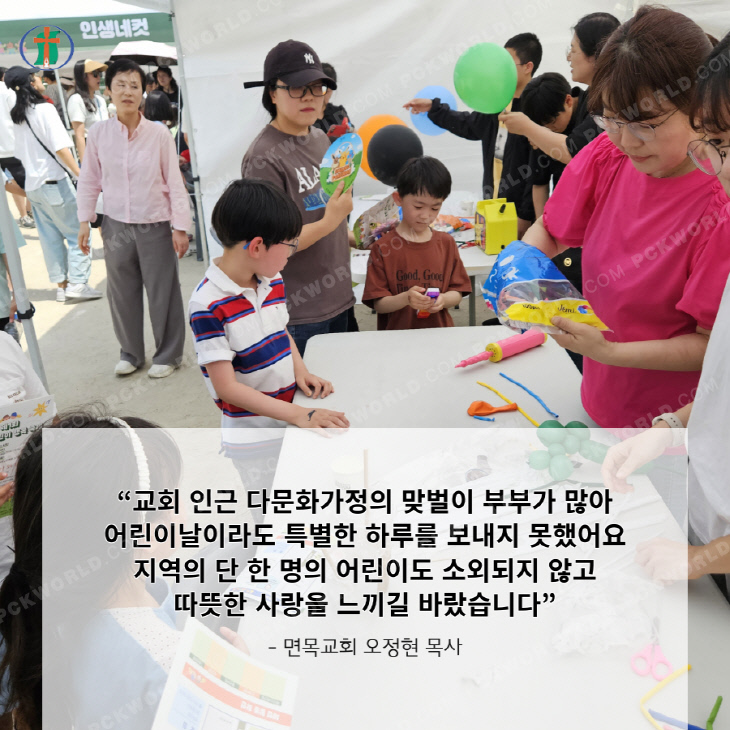[ 최은의 영화보기 ] 파벨만스
최 은 영화평론가
2024년 01월 12일(금) 00:00
|
생애 첫 영화관람에 나선 다섯 살 샘에게 아빠 버트 파벨만(폴 다노)이 설명을 시작한다. "무서워할 것 없어. 커다란 손전등 같은 빛이 있는데 그 앞을 초당 24장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가. 이걸 영사라고 하지. 사진 한 장은 머릿속에서 15분의 1초씩 머물러. 그건 잔상효과야…"
반면 엄마 미치(미셸 윌리엄스)는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한다.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 보고 나면 너도 모르게 활짝 웃고 있을걸."
아빠는 원리를 설명하고 엄마는 매혹을 전한다. 훗날 위대한 영화감독이 될 이 꼬마의 아빠는 컴퓨터를 다루는 공학자였고 엄마는 예술가였다. 아이는 마치 19세기에 탄생해 20세기를 풍미한 최고의 발명품이면서 동시에 예술인 필름영화의 속성을 혈통으로 안고 태어난 것 같다.
영화사의 살아있는 전설인 스티븐 스필버그(1946~ )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 '파벨만스'를 만들었다. 1952년 1월, 뉴저지의 극장에서 세실 드밀의 '지상 최대의 쇼'를 본 샘은 열차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 후 장난감 증기기관차로 그 장면을 재연한다. 엄마는 샘의 손에 아빠의 카메라를 들려주었고, 그렇게 해서 샘의 첫 연출작이 탄생했다.
얼핏 영화에 대한 노장의 향수와 사적인 회고를 담은 영화로 보이지만 '파벨만스'는 영화예술이 20세기 인류에 선물한 매혹과 놀라움에 대한 훌륭한 기록이며 헌사이기도 하다. 신기한 발명품에서 출발해 마침내 예술로 인정된 영화사의 백삼십 년 여정이 소년의 8mm, 16mm 카메라와 구식 편집기를 거쳐 눈앞에서 차르르 지나간다.
파벨만네 가족은 영화에서 두 번 이사를 하는데, 뉴저지에서 샘에게 영화는 깜짝 놀랄 볼거리였고 누구나 가짜인 줄 알지만 신나는 놀이였다면 애리조나의 피닉스에서 샘(가브리엘 라벨)에게 영화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자 자기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진지한 탐구활동이었다. 그러다가 가족캠핑에서 우연히 엄마의 불륜이 담긴 영상을 보고 샘은 영화를 그만두기로 할 만큼,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큰 충격을 받는다. 이제 그에게 영화는 현실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진실이 기록으로 남은, 따라서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금기'가 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샘에게 영화는 드디어 감독의 손을 떠나 스스로의 생을 지닌 어떤 것, 즉 현대예술이 된다. 졸업파티에서 상영한 '땡땡이의 날'에서 샘은 유대인이라고 내내 자신을 괴롭히고 폭행했던 로건을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뜻밖에도 로건은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수치를 느끼고 화를 내며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배우이자 관객으로서 로건의 반응은 영화가 폭력 없는 복수나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주었다.
스필버그는 이 이야기를 서부영화의 거장 존 포드와의 만남으로 마무리한다. 존 포드는 청년 샘에게 예술이란 지평선을 화면 중앙이 아니라 발아래 또는 머리 꼭대기에 두는, 그랬을 때 가장 흥미로운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샘'은 영화 예술에 관한 이 모든 진실을 남은 평생, 백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멋지게 증명해낼 예정이다.
이 모든 여정의 근원에 항상 '빛'이 있었다. 영사기의 라이트에서부터 '지상 최대의 쇼'에서 기차와 충돌하는 자동차의 불빛, 유대인인 샘의 집에만 없었던 크리스마스 전등과 하누카('빛의 축제'라 불린다)의 여덟 촛대, 가짜 총격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샘이 필름에 구멍을 뚫어 통과시킨 그 빛, 캠핑에서 엄마가 춤출 때 베니가 켜 놓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마지막에 존 포드 입 앞에서 타오르던 시가의 불꽃까지, 스필버그의 '파벨만스'는 빛에 대한 찬사와 매혹으로 가득한 영화다. 꼬마를 매혹했던 최초의 빛은 그가 평생을 투신한 예술이 되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어린 샘의 표정과 경이로 가득한 땡그란 두 눈을 다시 생각하며 나를 사로잡았던 어떤 빛을 떠올린다. 예술이란 실상 복음의 어떤 부분과 많이 닮았다. 과학이면서 예술인 영화 이미지처럼, 지식이면서도 믿음인 그 안에는 샘이 영화예술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 즉 최초의 놀람과 두려움, 경이와 즐거움과 웃음, 진실을 대면하는 고통과 세계의 흐름과 상식에 대한 저항, 뜻밖의 위로와 창의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
'파벨만스'와 함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소년을 사로잡은 빛을 따라 가다 보면, 미치가 말했듯이,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누군가의 꿈 덕분에 당신도 모르게 활짝 웃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무엇이든 한때 당신을 가슴 뛰게 했던 꿈의 한 자락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스필버그의 작품 중 가장 개인적인 이 영화는 예술로서 제 몫을 훌륭히 해낸 것이다. 볼 만 하지 않겠는가.
최 은 영화평론가/모두를위한기독교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반면 엄마 미치(미셸 윌리엄스)는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한다.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 보고 나면 너도 모르게 활짝 웃고 있을걸."
아빠는 원리를 설명하고 엄마는 매혹을 전한다. 훗날 위대한 영화감독이 될 이 꼬마의 아빠는 컴퓨터를 다루는 공학자였고 엄마는 예술가였다. 아이는 마치 19세기에 탄생해 20세기를 풍미한 최고의 발명품이면서 동시에 예술인 필름영화의 속성을 혈통으로 안고 태어난 것 같다.
영화사의 살아있는 전설인 스티븐 스필버그(1946~ )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 '파벨만스'를 만들었다. 1952년 1월, 뉴저지의 극장에서 세실 드밀의 '지상 최대의 쇼'를 본 샘은 열차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 후 장난감 증기기관차로 그 장면을 재연한다. 엄마는 샘의 손에 아빠의 카메라를 들려주었고, 그렇게 해서 샘의 첫 연출작이 탄생했다.
얼핏 영화에 대한 노장의 향수와 사적인 회고를 담은 영화로 보이지만 '파벨만스'는 영화예술이 20세기 인류에 선물한 매혹과 놀라움에 대한 훌륭한 기록이며 헌사이기도 하다. 신기한 발명품에서 출발해 마침내 예술로 인정된 영화사의 백삼십 년 여정이 소년의 8mm, 16mm 카메라와 구식 편집기를 거쳐 눈앞에서 차르르 지나간다.
파벨만네 가족은 영화에서 두 번 이사를 하는데, 뉴저지에서 샘에게 영화는 깜짝 놀랄 볼거리였고 누구나 가짜인 줄 알지만 신나는 놀이였다면 애리조나의 피닉스에서 샘(가브리엘 라벨)에게 영화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자 자기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진지한 탐구활동이었다. 그러다가 가족캠핑에서 우연히 엄마의 불륜이 담긴 영상을 보고 샘은 영화를 그만두기로 할 만큼,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큰 충격을 받는다. 이제 그에게 영화는 현실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진실이 기록으로 남은, 따라서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금기'가 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샘에게 영화는 드디어 감독의 손을 떠나 스스로의 생을 지닌 어떤 것, 즉 현대예술이 된다. 졸업파티에서 상영한 '땡땡이의 날'에서 샘은 유대인이라고 내내 자신을 괴롭히고 폭행했던 로건을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뜻밖에도 로건은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수치를 느끼고 화를 내며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배우이자 관객으로서 로건의 반응은 영화가 폭력 없는 복수나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주었다.
스필버그는 이 이야기를 서부영화의 거장 존 포드와의 만남으로 마무리한다. 존 포드는 청년 샘에게 예술이란 지평선을 화면 중앙이 아니라 발아래 또는 머리 꼭대기에 두는, 그랬을 때 가장 흥미로운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샘'은 영화 예술에 관한 이 모든 진실을 남은 평생, 백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멋지게 증명해낼 예정이다.
이 모든 여정의 근원에 항상 '빛'이 있었다. 영사기의 라이트에서부터 '지상 최대의 쇼'에서 기차와 충돌하는 자동차의 불빛, 유대인인 샘의 집에만 없었던 크리스마스 전등과 하누카('빛의 축제'라 불린다)의 여덟 촛대, 가짜 총격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샘이 필름에 구멍을 뚫어 통과시킨 그 빛, 캠핑에서 엄마가 춤출 때 베니가 켜 놓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마지막에 존 포드 입 앞에서 타오르던 시가의 불꽃까지, 스필버그의 '파벨만스'는 빛에 대한 찬사와 매혹으로 가득한 영화다. 꼬마를 매혹했던 최초의 빛은 그가 평생을 투신한 예술이 되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어린 샘의 표정과 경이로 가득한 땡그란 두 눈을 다시 생각하며 나를 사로잡았던 어떤 빛을 떠올린다. 예술이란 실상 복음의 어떤 부분과 많이 닮았다. 과학이면서 예술인 영화 이미지처럼, 지식이면서도 믿음인 그 안에는 샘이 영화예술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 즉 최초의 놀람과 두려움, 경이와 즐거움과 웃음, 진실을 대면하는 고통과 세계의 흐름과 상식에 대한 저항, 뜻밖의 위로와 창의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
'파벨만스'와 함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소년을 사로잡은 빛을 따라 가다 보면, 미치가 말했듯이,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누군가의 꿈 덕분에 당신도 모르게 활짝 웃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무엇이든 한때 당신을 가슴 뛰게 했던 꿈의 한 자락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스필버그의 작품 중 가장 개인적인 이 영화는 예술로서 제 몫을 훌륭히 해낸 것이다. 볼 만 하지 않겠는가.
최 은 영화평론가/모두를위한기독교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