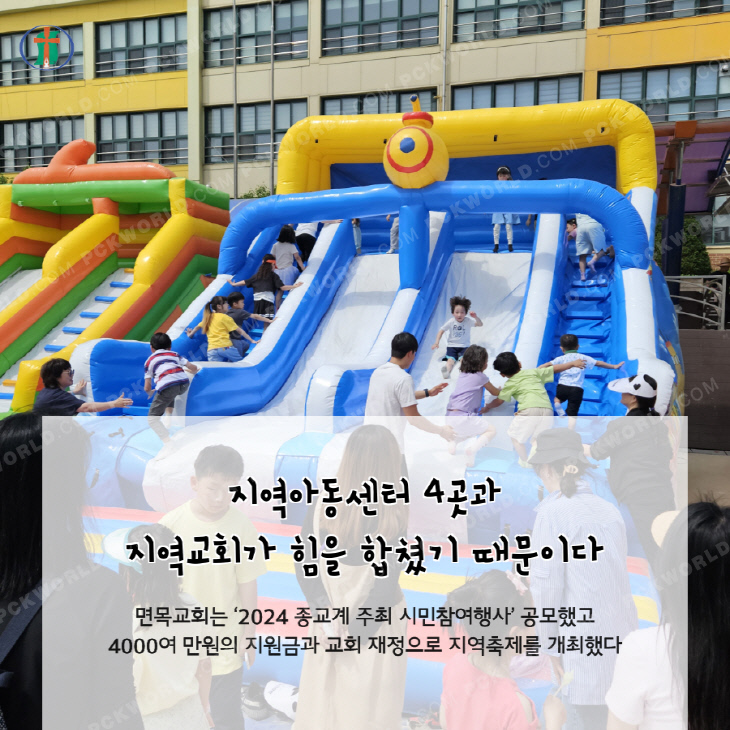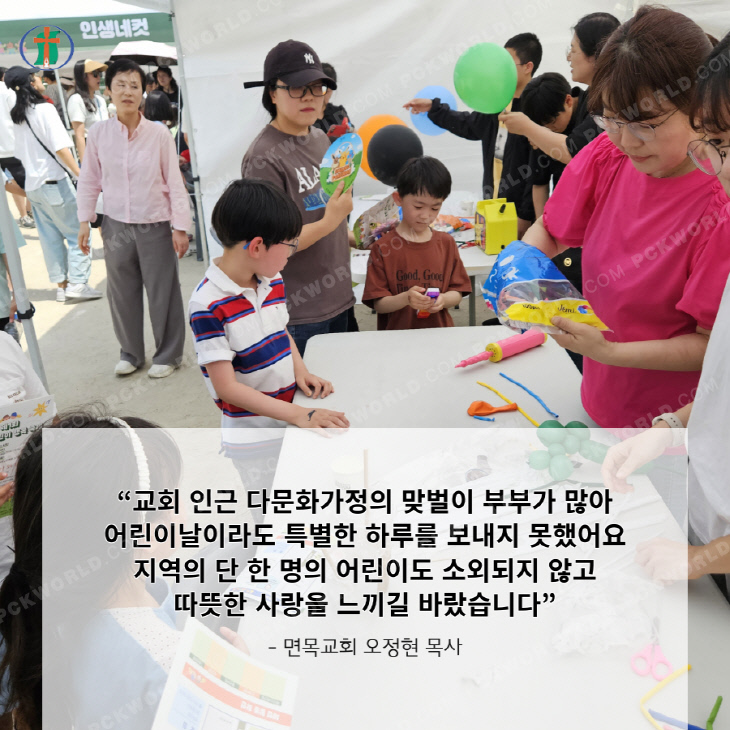[ 선교여성과 교회 ] 전남 지역 여전도회 34
한국기독공보
2023년 09월 07일(목) 19:11
|
엘리제 쉐핑은 1912년 우리나라에 왔다. 쉐핑은 1934년 쉰 넷의 나이에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죽은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다. 그녀는 궁핍한 조선에 와서 22년간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녀가 삶의 정점에서 마지막 불꽃을 지폈던 전라남도는 당시 인구 220만 명 가운데 88만 명이 굶는 형편이었다. 광주 인근엔 집도 없이 유리걸식하는 순수한 걸인이 자그마치 11만 명을 헤아리던 때였다.
그야말로 초근목피로 질긴 목숨을 이어가던 시대다. 처녀의 몸으로 와서 그가 목도한 조선인의 삶을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못 먹고 영양실조에서 오는 결핵 환자와 남도지방에 독버섯 같던 문둥병자들이다.
요즘에야 한센환자라는 제법 고상한 이름으로 불러주지만 당시에는 '문둥이'라는 이름의 저주받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당시 부산과 진해, 마산, 목포와 나주, 광주 인근 날씨가 온화한 남도 지역에 널린 문둥이가 2만 2000명이었다.
엘리제가 본격적으로 광주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가 1919년이다. 고종이 일본인들에게 독살 당했다는 소문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3·1독립만세 사건으로 투옥된 독립운동가의 옥바라지를 하다 일제의 눈 밖에 나자 서울에 머무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세브란스에서 간호원을 양성하다 광주로 내려온 그는 나머지 삶을 불꽃같은 자세로 광주 제중병원에서 간호부로 일했다.
누구도 꺼려하던 문둥병환자를 돌보는 틈틈이 한 해에 3개월 이상을 조랑말을 타고 지리산 자락과 광주 인근의 시골을 돌며 병자를 치료했다. 이름조차 없이 노예적 삶을 살던 조선 여인들을 가르치고 '큰 년, 작은 년, 개똥이 엄마'로만 불리던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사람으로 사는 즐거움과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 쉐핑에게 있어서 거룩의 의미
선교사라는 직업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결코 지나치기 어려운 그에게는 '조선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어야만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자신을 괴롭히는 숙제였다. 그의 보고서에는 그가 여정에서 만난 조선 여성 500명 가운데 온전한 상태의 여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한다.
병들고 무지하고 남편에게 소박맞고 소작때기 상태에서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는 모습 앞에서 눈물이 마를 새 없었다. 여정에서 돌아오면 그가 함께 기숙하며 가르치던 이일학교의 학생들은 엘리제가 시골집을 전전하는 동안 묻혀온 이를 잡느라 밤을 새우는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 이질과 발진 티푸스 같은 괴질로 죽어 나가던 공포의 시절이었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지불했던 수고와 경비를 셈하면서 '내가 과연 이들에게 이만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스스로 자문했다. 결론은 언제나 마찬가지다.
"달러와 센트로 따지면 분명 가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들과 나누었던 교제로 조선인들이 받았던 위로와 격려는 제가 지불한 돈의 가치 이상으로 분명하고 황홀하기조차 합니다."
그녀에게는 '문둥이 어머니'라는 별명이 뒤따른다. 일본 당국이 문둥이의 씨를 말릴 요량으로 강제로 정관시술을 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자, 분개한 엘리제는 최흥종 목사와 함께 수백 명의 나환자들을 이끌고 조선 총독부를 향해 대행진을 감행한다.
광주를 떠날 때 150명이었던 무리가 서울에 이르렀을 때에는 자그마치 500명이 넘는 숫자로 불어났다. 올라가는 도중에 춥고 힘들었던 대행진에 여러 명이 죽기도 했다. 그들은 총독부 앞에서 손뼉을 치고 발로 땅을 구르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결국 총독이 굴복해 강제로 정관시술을 하지 않고 소록도에 문둥이를 위한 갱생복지시설을 늘려줄 것을 약속했다. 그야말로 문둥병자들과 함께 이뤄낸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이요 민중적 사건이었다.
우리나라가 쇄국의 빗장을 걷어낸 이후 이 땅에서 일한 선교사의 수효가 2000명이 넘었다. 물론 선교를 목적으로 온 그들이지만 처절한 조선인의 삶의 질과 나라 잃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대부분이 조선인의 친구로 살았다.
더러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 땅의 유지처럼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제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닌 '조선인으로 조선인의 일부'가 되고자 했다. 자신의 이름도 서서평이라는 조선식 이름으로 고쳐 살았다. 오죽했으면 그녀가 죽고 난 이후 엘리제를 기리는 동아일보의 추모 사설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
"백만장자의 위치에 지지 않을 집에 편히 앉아서 남녀 하인을 두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일부 선교사들의 귀에 엘리제 쉐핑의 일생은 어떤 음성으로 전해질까? 이국 여성으로서 된장국에 꽁보리밥을 먹으며 남자들 검정고무신을 신고 무명 치마를 즐겨 입고 조선인으로 살며 조선인을 위해 바친 쉐핑의 삶이 이러하거늘 양심 있는 조선의 신여성들 가운데 그녀의 뒤를 따를 자 그 몇몇이뇨!"
그야말로 초근목피로 질긴 목숨을 이어가던 시대다. 처녀의 몸으로 와서 그가 목도한 조선인의 삶을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못 먹고 영양실조에서 오는 결핵 환자와 남도지방에 독버섯 같던 문둥병자들이다.
요즘에야 한센환자라는 제법 고상한 이름으로 불러주지만 당시에는 '문둥이'라는 이름의 저주받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당시 부산과 진해, 마산, 목포와 나주, 광주 인근 날씨가 온화한 남도 지역에 널린 문둥이가 2만 2000명이었다.
엘리제가 본격적으로 광주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가 1919년이다. 고종이 일본인들에게 독살 당했다는 소문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3·1독립만세 사건으로 투옥된 독립운동가의 옥바라지를 하다 일제의 눈 밖에 나자 서울에 머무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세브란스에서 간호원을 양성하다 광주로 내려온 그는 나머지 삶을 불꽃같은 자세로 광주 제중병원에서 간호부로 일했다.
누구도 꺼려하던 문둥병환자를 돌보는 틈틈이 한 해에 3개월 이상을 조랑말을 타고 지리산 자락과 광주 인근의 시골을 돌며 병자를 치료했다. 이름조차 없이 노예적 삶을 살던 조선 여인들을 가르치고 '큰 년, 작은 년, 개똥이 엄마'로만 불리던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사람으로 사는 즐거움과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 쉐핑에게 있어서 거룩의 의미
선교사라는 직업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결코 지나치기 어려운 그에게는 '조선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어야만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자신을 괴롭히는 숙제였다. 그의 보고서에는 그가 여정에서 만난 조선 여성 500명 가운데 온전한 상태의 여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한다.
병들고 무지하고 남편에게 소박맞고 소작때기 상태에서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는 모습 앞에서 눈물이 마를 새 없었다. 여정에서 돌아오면 그가 함께 기숙하며 가르치던 이일학교의 학생들은 엘리제가 시골집을 전전하는 동안 묻혀온 이를 잡느라 밤을 새우는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 이질과 발진 티푸스 같은 괴질로 죽어 나가던 공포의 시절이었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지불했던 수고와 경비를 셈하면서 '내가 과연 이들에게 이만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스스로 자문했다. 결론은 언제나 마찬가지다.
"달러와 센트로 따지면 분명 가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들과 나누었던 교제로 조선인들이 받았던 위로와 격려는 제가 지불한 돈의 가치 이상으로 분명하고 황홀하기조차 합니다."
그녀에게는 '문둥이 어머니'라는 별명이 뒤따른다. 일본 당국이 문둥이의 씨를 말릴 요량으로 강제로 정관시술을 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자, 분개한 엘리제는 최흥종 목사와 함께 수백 명의 나환자들을 이끌고 조선 총독부를 향해 대행진을 감행한다.
광주를 떠날 때 150명이었던 무리가 서울에 이르렀을 때에는 자그마치 500명이 넘는 숫자로 불어났다. 올라가는 도중에 춥고 힘들었던 대행진에 여러 명이 죽기도 했다. 그들은 총독부 앞에서 손뼉을 치고 발로 땅을 구르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결국 총독이 굴복해 강제로 정관시술을 하지 않고 소록도에 문둥이를 위한 갱생복지시설을 늘려줄 것을 약속했다. 그야말로 문둥병자들과 함께 이뤄낸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이요 민중적 사건이었다.
우리나라가 쇄국의 빗장을 걷어낸 이후 이 땅에서 일한 선교사의 수효가 2000명이 넘었다. 물론 선교를 목적으로 온 그들이지만 처절한 조선인의 삶의 질과 나라 잃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대부분이 조선인의 친구로 살았다.
더러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 땅의 유지처럼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제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닌 '조선인으로 조선인의 일부'가 되고자 했다. 자신의 이름도 서서평이라는 조선식 이름으로 고쳐 살았다. 오죽했으면 그녀가 죽고 난 이후 엘리제를 기리는 동아일보의 추모 사설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
"백만장자의 위치에 지지 않을 집에 편히 앉아서 남녀 하인을 두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일부 선교사들의 귀에 엘리제 쉐핑의 일생은 어떤 음성으로 전해질까? 이국 여성으로서 된장국에 꽁보리밥을 먹으며 남자들 검정고무신을 신고 무명 치마를 즐겨 입고 조선인으로 살며 조선인을 위해 바친 쉐핑의 삶이 이러하거늘 양심 있는 조선의 신여성들 가운데 그녀의 뒤를 따를 자 그 몇몇이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