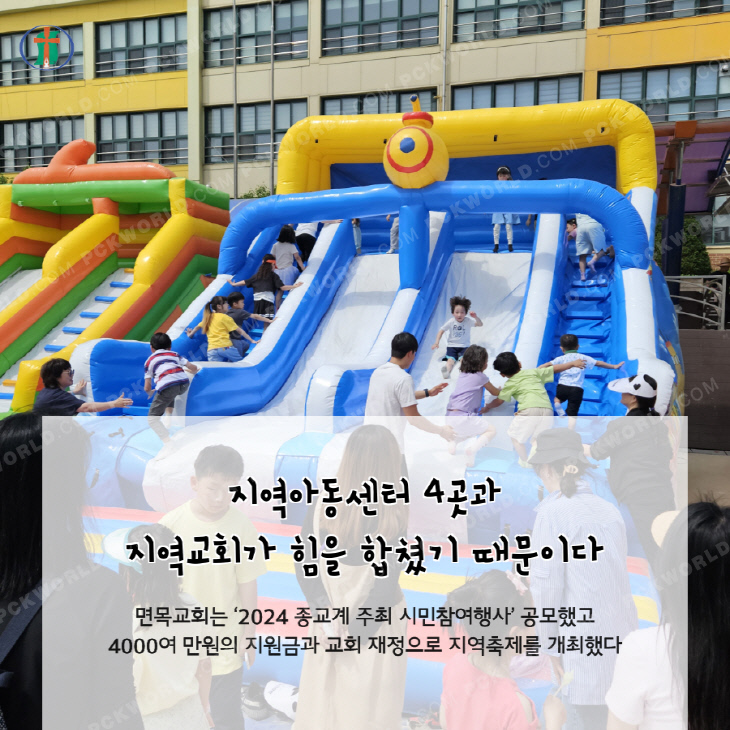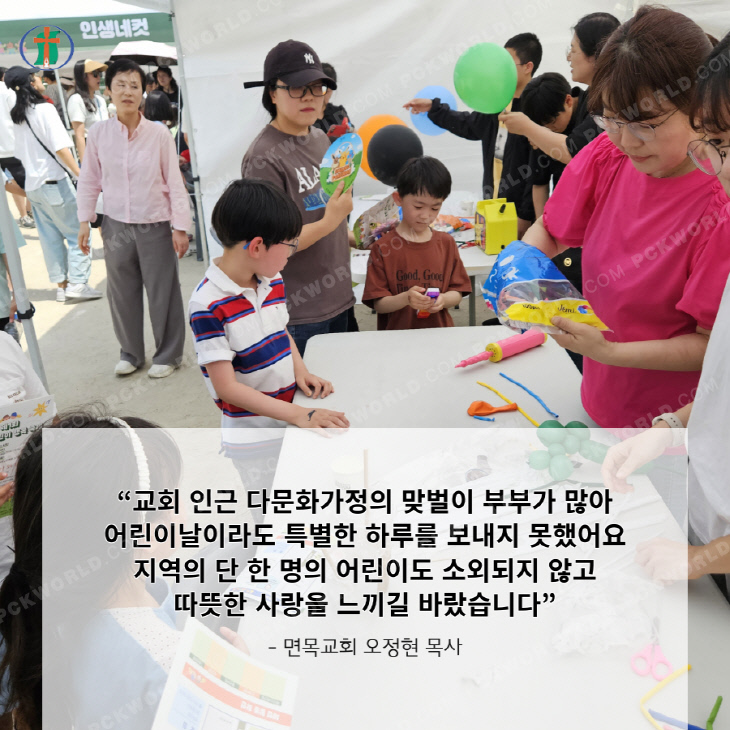[ 현장칼럼 ]
이원영 목사
2022년 04월 22일(금) 00:10
|
농사를 배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매일 일기예보와 달력의 절기를 확인하는 일이다. 농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다. 사람은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작물이 잘 자라도록 퇴비를 주고 김을 맨다. 적절한 햇빛과 강우가 필요하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 씨앗의 노력도 필요하다.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늘과 작물의 생명, 그리고 사람이 연합할 때 식탁이 풍요로워진다.
4월 5일은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청명(淸明)이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종묘상 앞이 만원이다. 가게 앞은 각종 채소 모종과 모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나는 춘분이 지난 5일에 감자를 심고 청명 이후로 모종과 씨앗을 구입해 심고 뿌렸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을 때마다 찬송가 한 구절이 흘러나온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찬송가 496장 3절)"
농사를 배울 때도 그랬고 올해부터 스스로 하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는 내 마음을 뚫고 입술로 나와 나의 파종을 조심스럽게 만든다. 씨는 잘 뿌렸는지, 물을 적당하게 주었는지, 뿌리는 잘 내리고 있는지 걱정스러워 파종이 끝난 후에도 이랑 사이를 돌아본다. 가끔은 잘 자라고 있는지 땅을 헤집고 씨앗과 모종의 활착(活着)을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다.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 상(上)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춘추시대 중국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다. 모내기를 한 이후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해서 논에 가보니 자기 논의 벼가 다른 사람의 벼보다 덜 자란 것 같았다. 농부는 궁리 끝에 벼의 순을 잡아 빼보니 약간 더 자란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식구들에게 하루종일 벼의 순을 빼느라 힘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자 식구들이 기겁하였다. 이튿날 아들이 논에 가보니 벼는 이미 하얗게 말라 죽어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고 한다. 꼭 내 이야기 같다. 농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씨앗의 협력임을 기억하고 한 주를 보내면 땅을 뚫고 새싹이 쑥하고 올라와 있다. 너무도 기특하고 고마워 밭에 쪼그리고 앉아 새싹을 한참 바라보다 깨달음을 얻는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신주의에 빠져 있다.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서 원하는 식품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최소 3개월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도 때가 차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갓, 무를 다 키우려면 1년 안에 김치를 먹기 힘들다. 김치 안에 농부의 1년이란 시간이 담겨있다.
농사는 생명을 키우는 일이면서 생명(시간)을 불어넣는 일이다. 농부와 더불어 만물의 시간(생명) 없이 식물은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온 삶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생을 음식쓰레기처럼 쉽게 버리거나 낭비하면 안된다. 농부의 1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귀하게 가꿔가야 한다. 그러면 나중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원영 목사 / 기독교환경연대
4월 5일은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청명(淸明)이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종묘상 앞이 만원이다. 가게 앞은 각종 채소 모종과 모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나는 춘분이 지난 5일에 감자를 심고 청명 이후로 모종과 씨앗을 구입해 심고 뿌렸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을 때마다 찬송가 한 구절이 흘러나온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찬송가 496장 3절)"
농사를 배울 때도 그랬고 올해부터 스스로 하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는 내 마음을 뚫고 입술로 나와 나의 파종을 조심스럽게 만든다. 씨는 잘 뿌렸는지, 물을 적당하게 주었는지, 뿌리는 잘 내리고 있는지 걱정스러워 파종이 끝난 후에도 이랑 사이를 돌아본다. 가끔은 잘 자라고 있는지 땅을 헤집고 씨앗과 모종의 활착(活着)을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다.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 상(上)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춘추시대 중국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다. 모내기를 한 이후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해서 논에 가보니 자기 논의 벼가 다른 사람의 벼보다 덜 자란 것 같았다. 농부는 궁리 끝에 벼의 순을 잡아 빼보니 약간 더 자란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식구들에게 하루종일 벼의 순을 빼느라 힘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자 식구들이 기겁하였다. 이튿날 아들이 논에 가보니 벼는 이미 하얗게 말라 죽어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고 한다. 꼭 내 이야기 같다. 농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씨앗의 협력임을 기억하고 한 주를 보내면 땅을 뚫고 새싹이 쑥하고 올라와 있다. 너무도 기특하고 고마워 밭에 쪼그리고 앉아 새싹을 한참 바라보다 깨달음을 얻는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신주의에 빠져 있다.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서 원하는 식품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최소 3개월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도 때가 차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갓, 무를 다 키우려면 1년 안에 김치를 먹기 힘들다. 김치 안에 농부의 1년이란 시간이 담겨있다.
농사는 생명을 키우는 일이면서 생명(시간)을 불어넣는 일이다. 농부와 더불어 만물의 시간(생명) 없이 식물은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온 삶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생을 음식쓰레기처럼 쉽게 버리거나 낭비하면 안된다. 농부의 1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귀하게 가꿔가야 한다. 그러면 나중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원영 목사 / 기독교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