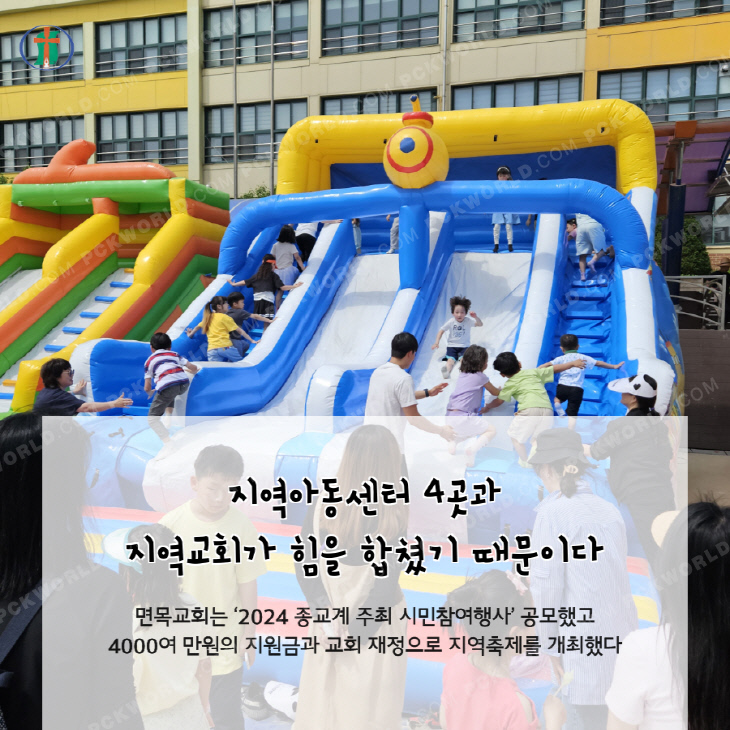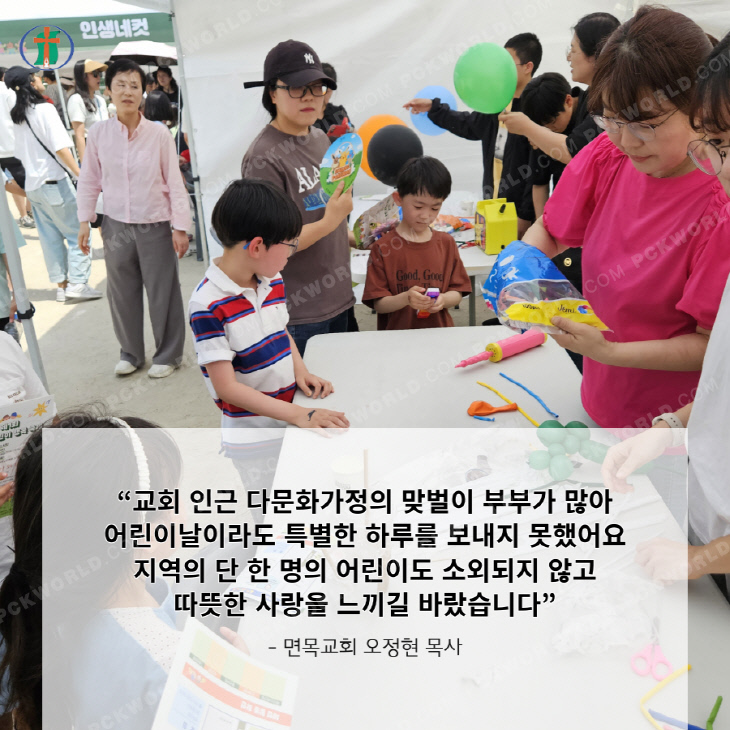[ нҳ„мһҘм№јлҹј ]
м•Ҳм§Җм„ұ лӘ©мӮ¬
2022л…„ 10мӣ” 28мқј(кёҲ) 00:10
|
мҪ”лЎңлӮҳ 19лҠ” м „нҳҖ мҳҲмғҒн•ҳм§Җ лӘ»н–ҲлҚҳ м„ёмғҒмқ„ к°‘мһҗкё° мҡ°лҰ¬ кіҒмңјлЎң лҚ°л ӨлӢӨ мЈјм—ҲлӢӨ. к·ёлҸҷм•Ҳ лӢ№м—°н•ҳкІҢ мғқк°Ғн•ҙ мҷ”лҚҳ кІғл“Өмқҙ л¬ҙл„Ҳм§Җкі , лӢӨлҘҙкІҢ ліҙмқҙкё° мӢңмһ‘н–ҲлӢӨ. н•ҷкөҗлҸ„ к·ё мӨ‘ н•ҳлӮҳлӢӨ. лҢҖлӢӨмҲҳ мҡ°лҰ¬ мӮ¬нҡҢмқҳ кө¬м„ұмӣҗл“ӨмқҖ н•ҷкөҗлҠ” көҗмңЎмқ„ н•ҳлҠ” кіімқҙлқјлҠ” л§үм—°н•ң н•©мқҳлҘј к°Җм§Җкі мһҲм—ҲлӢӨ. к·ёлҹ°лҚ° л§үмғҒ н•ҷкөҗлҘј мүјмңјлЎң лҠҗлҒјкІҢ лҗң кіөл°ұмқҖ м§ҖмӢқмқ„ м „лӢ¬н•ҳлҠ” көҗмңЎл§Ңмқҙ м•„лӢҲм—ҲлӢӨ. мҳӨнһҲл Ө м җмӢ¬ кёүмӢқмқҳ кіөл°ұмқҙ м»ёкі , м№ңкө¬л“Өкіј м„ мғқлӢҳл“Өкіј л§әм—ҲлҚҳ кҙҖкі„лӮҳ мӮ¬нҡҢм Ғ көҗлҘҳмқҳ кіөл°ұ, мӢ мІҙ нҷңлҸҷмқҳ кіөл°ұк№Ңм§Җ вҖҰ. н•ҷкөҗк°Җ к·ёлҸҷм•Ҳ мҡ°лҰ¬ мӮ¬нҡҢм—җм„ң мҲҳн–үн–ҲлҚҳ кё°лҠҘмқҖ м§ҖмӢқмқ„ м „н•ҙмЈјлҠ” көҗмңЎ к·ё мқҙмғҒмқҳ кІғмқҙм—ҲлӢӨ. н•ҷкөҗлҠ” н•ҷл №кё° м•„лҸҷ мІӯмҶҢл…„л“Өм—җкІҢ м•Ҳм „н•ң мһҲмқ„ кіікіј лЁ№мқ„ кұ°лҰ¬лҘј м ңкіөн•ҳлҠ” лҸҢлҙ„мқҳ кіөк°„мқҙм—Ҳкі м№ңкө¬л“Өкіј м„ мғқлӢҳл“Өкіјмқҳ кҙҖкі„лҘј нҶөн•ҙ м Ғм Ҳн•ң мӮ¬нҡҢнҷ”мқҳ кіјм •мқ„ кІҪн—ҳн•ҳлҠ”, кұ°мқҳ мң мқјн•ң кіөк°„мқҙм—ҲлӢӨ. л”°лқјм„ң мҡ°лҰ¬ мӮ¬нҡҢм—җм„ң н•ҷкөҗлҘј к°Җм§Җ м•ҠлҠ”лӢӨлҠ” кІғмқҖ мөңмҶҢн•ңмқҳ лҸҢлҙ„мқ„ л°ӣм§Җ лӘ»н•ҳкІҢ лҗңлӢӨлҠ” кІғ, м Ғм Ҳн•ң мӮ¬нҡҢнҷ”мқҳ кіјм •мқ„ кұ°м№ҳм§Җ лӘ»н•ҳкІҢ лҗңлӢӨлҠ” кІғмқ„ мқҳлҜён•ңлӢӨ.
н•ҷкөҗм—җ м Ғмқ‘н•ҳм§Җ лӘ»н•ҳлҠ” мІӯмҶҢл…„л“Өмқҙ л§һлӢҘлңЁлҰ¬лҠ” нҳ„мӢӨмқҖ мҪ”лЎңлӮҳлЎң н•ҷкөҗк°Җ л©Ҳ추кІҢ лҗҳм—Ҳмқ„ л•Ң лӘЁл“ мІӯмҶҢл…„л“Өмқҙ л§ҲмЈјн–ҲлҚҳ нҳ„мӢӨкіј лі„л°ҳ лӢӨлҘҙм§Җ м•ҠлӢӨ. н•ң к°Җм§Җ лӢӨлҘё м җмқҙ мһҲлӢӨл©ҙ мҪ”лЎңлӮҳлҠ” м „мІҙлҘј л©Ҳ추кІҢ н–Ҳм§Җл§Ң, н•ҷкөҗ л¶Җм Ғмқ‘ мІӯмҶҢл…„л“ӨмқҖ н•ҷкөҗмҷҖ м№ңкө¬л“ӨмқҖ м—¬м „н•ңлҚ° к·ёл“Өл§Ң м ңмҷёлҗңлӢӨлҠ” м җмқҙлӢӨ. к·ёл“Өл§Ң лҸҢлҙ„мқҳ л¶Җмһ¬лҘј кІҪн—ҳн•ҳкі , к·ёл“Өл§Ң мӮ¬нҡҢм Ғ кҙҖкі„л§қмңјлЎңл¶Җн„° кі лҰҪлҗңлӢӨ. мқҙлҹ¬н•ң мң„кё°м—җ л…ём¶ңлҗң м•„мқҙл“Өмқҙ н•ҷкөҗлҘј л– лӮҳкё° м „м—җ л§Ҳм§Җл§ү лҸҷм•„мӨ„лЎң м„ нғқн•ҳлҠ” кІғмқҙ лҢҖм•ҲкөҗмңЎ мң„нғҒкөҗмңЎкё°кҙҖмқҙлӢӨ.
м§ҖлӮң н•ҙ, н•ң н•ҙлҘј н•Ёк»ҳ ліҙлғҲлҚҳ м•„мқҙл“ӨмқҖ мқҙл ҮкІҢ м Җл ҮкІҢ мҶҢмӢқмқ„ л“ЈкІҢ лҗңлӢӨ. к·ё мӨ‘ 2лӘ…мқҳ м№ңкө¬л“ӨмқҖ м§ҖкёҲлҸ„ мқјмЈјмқјмқҙ л©ҖлӢӨ н•ҳкі мҡ°лҰ¬ кіөк°„мқ„ л“ӨлқҪкұ°лҰ°лӢӨ. м•„м§Ғ мғҲлЎңмҡҙ н•ҷкөҗм—җм„ң мҷ„м „нһҲ м Ғмқ‘мқ„ лӘ»н–ҲлӢӨлҠ” лң»мқҙлӢӨ. мғҲлЎңмҡҙ м№ңкө¬л“Өмқ„ мӮ¬к·Җм§Җ лӘ»н–Ҳкұ°лӮҳ м—¬м „нһҲ л§ҲмқҢ л‘ҳ кіімқҙ м—Ҷм–ҙм„ң мһ мӢң мҷҖм„ң мҲҳлӢӨлҘј л–Ёкі к°Җкұ°лӮҳ, л©ҳнҶ м„ мғқлӢҳкіј мӣҗн•ҳлҠ” кіөл¶ҖлҘј н•ҳкё°лҸ„ н•ңлӢӨ. лҳҗ лӢӨлҘё м№ңкө¬лҠ” мӢ¬к°Ғн•ң мӮ¬м•ҲмңјлЎң мқҳлў°лҗҳм—ҲлҚҳ м№ңкө¬мҳҖлҠ”лҚ° мӣҗлһҳ лӢӨлӢҲлҚҳ н•ҷкөҗм—җ л¬ҙмҠЁ мқј мһҲм—Ҳлғҗ мӢ¶кІҢ м Ғмқ‘мқ„ мһҳ н•ҙм„ң м„ мғқлӢҳл“Өмқҳ к°җмӮ¬ мқёмӮ¬к°Җ н•ң нҠёлҹӯмқҙлӢӨ. н•ҷкөҗ лӢӨлӢҲлҠ” лҸҷм•Ҳ л§җ н•ңл§Ҳл”” м—Ҷмқҙ мЎём—…н•ң м№ңкө¬лҠ” м°ё к°җмӮ¬н–Ҳл…ёлқјл©° лӯҗ лҸ„мҡё мқјмқҖ м—ҶлҠҗлғҗкі мқҳм “н•ҳкІҢ 묻기лҸ„ н•ңлӢӨ.
мҡ°лҰ¬к°Җ м•„л¬ҙ мқјлҸ„ мқјм–ҙлӮҳм§Җ м•ҠлҠ”лӢӨкі лҠҗкјҲлҚҳ к·ё лӢөлӢөн•ң мҲңк°„л“Өм—җлҸ„ м•„мқҙл“Өм—җкІҢлҠ” м–ҙл–Ө мқјмқҙ мқјм–ҙлӮҳкі мһҲм—Ҳкі , к·ё мқјл“Ө мҶҚм—җм„ң м•„мқҙл“ӨмқҖ м„ұмһҘн•ҳкі мһҲм—ҲлҚҳ кІғмқҙлӢӨ.
м•„мқҙл“ӨмқҖ мҡ°лҰ¬ мӮ¬нҡҢмқҳ лӘЁмҠөмқ„ к·ёлҢҖлЎң л“ңлҹ¬лӮҙ ліҙм—¬мЈјлҠ” 맑мқҖ кұ°мҡё к°ҷлӢӨ. к·ёлҹ°лҚ° м җм җ лҚ” м•„мқҙл“Өмқҙ л§Һмқҙ м•„н”Ҳ кІғмІҳлҹј лҠҗк»ҙ진лӢӨ. ADHD, мҡ°мҡё, л¶Ҳм•Ҳ, кіөнҷ©, мһҗн•ҙ충лҸҷ л“ұ м•„мқҙл“Өмқҙ ліҙм—¬мЈјлҠ” м •мӢ кұҙк°•мқҳ м§Җн‘ңлҠ” м җм җ лҚ” лӮҳл№ м§ҖлҠ” кІғмІҳлҹј ліҙмқёлӢӨ. кІҢлӢӨк°Җ м•„мқҙл“Ө мӮ¬мқҙм—җм„ң л§Ңм—°н•ң н•ҷкөҗ нҸӯл Ҙ, кұ°мқҳ мқјмЈјмқјмқҙ л©ҖлӢӨ н•ҳкі м—ҙлҰ¬лҠ” н•ҷкөҗнҸӯл Ҙмң„мӣҗнҡҢлҘј ліҙкі мһҲмңјл©ҙ л¬ҙм–ёк°Җ мӨ‘мҡ”н•ң кІғмқҙ лҶ“міҗм§Җкі мһҲлӢӨлҠ” лҠҗлӮҢмқ„ м§Җмҡё мҲҳк°Җ м—ҶлӢӨ.
к°Ғмһҗмқҳ мқҙмң лЎң н•ҷкөҗм—җ м Ғмқ‘н•ҳм§Җ лӘ»н•ҙ лҢҖм•ҲкөҗмңЎ мң„нғҒкөҗмңЎкё°кҙҖмқҙлқјлҠ” мғҲлЎңмҡҙ н•ҷкөҗм—җ мһҗлҰ¬ мһЎмқҖ м•„мқҙл“Өм—җкІҢ мқҙ мһ‘мқҖ н•ҷкөҗлҠ” м–ҙл–Ө кіөк°„мңјлЎң кё°м–өлҗ к№Ң? лҢҖлӢЁн•ң лҢҖм•Ҳмқҙ лҗҳкё° ліҙлӢӨлҠ” к·ёлғҘ м§ҖкёҲмқҳ н•ҷкөҗк°Җ мҲҳн–үн•ҳкі мһҲлҚҳ мҲңкё°лҠҘмқ„ мқҙ мһ‘мқҖ н•ҷкөҗм—җм„ң м•„мқҙл“Өмқҙ л§ҲмқҢк»Ҹ л§ӣліј мҲҳ мһҲкІҢ лҗҳкё°лҘј л°”лһҖлӢӨ. м•Ҳм „н•ҳкІҢ лЁёл¬ј кіікіј м ң л•Ңм—җ лЁ№мқ„ кұ°лҰ¬лҘј м ңкіөн•ҳлҠ” лҸҢлҙ„, м№ңкө¬л“Өкіј м„ мғқлӢҳл“Өкіј н•Ёк»ҳ н•ҳлҠ” кҙҖкі„мқҳ м—°мҠө, мқҙкІғл§Ң н• мҲҳ мһҲм–ҙлҸ„ кҪӨ к·јмӮ¬н•ң н•ҷкөҗлқјлҠ” мғқк°Ғмқҙ л“ лӢӨ. к·ёлҰ¬кі к·ё кіјм •м—җм„ң м„ңлЎңк°Җ м„ңлЎңм—җкІҢ л¬ҙмІҷ мҶҢмӨ‘н•ҳкі мӨ‘мҡ”н•ң мЎҙмһ¬лқјлҠ” кІғмқ„ мЎ°кёҲл§Ң лҚ” м•ҢкІҢ лҗңлӢӨл©ҙ, м •л§җ лҚ”н• лӮҳмң„ м—Ҷмқҙ мўӢмқ„ кІғ к°ҷлӢӨ. м–ҙм©Ңл©ҙ мҡ°лҰ¬мқҳ кҝҲмқҖ мҡ°лҰ¬лҸ„ лӘЁлҘҙлҠ” мӮ¬мқҙм—җ лӮ л§ҲлӢӨ мқҙлЈЁм–ҙм§Җкі мһҲлҠ”м§ҖлҸ„ лӘЁлҘёлӢӨ.
м•Ҳм§Җм„ұ лӘ©мӮ¬/ мғҲн„°көҗнҡҢ
н•ҷкөҗм—җ м Ғмқ‘н•ҳм§Җ лӘ»н•ҳлҠ” мІӯмҶҢл…„л“Өмқҙ л§һлӢҘлңЁлҰ¬лҠ” нҳ„мӢӨмқҖ мҪ”лЎңлӮҳлЎң н•ҷкөҗк°Җ л©Ҳ추кІҢ лҗҳм—Ҳмқ„ л•Ң лӘЁл“ мІӯмҶҢл…„л“Өмқҙ л§ҲмЈјн–ҲлҚҳ нҳ„мӢӨкіј лі„л°ҳ лӢӨлҘҙм§Җ м•ҠлӢӨ. н•ң к°Җм§Җ лӢӨлҘё м җмқҙ мһҲлӢӨл©ҙ мҪ”лЎңлӮҳлҠ” м „мІҙлҘј л©Ҳ추кІҢ н–Ҳм§Җл§Ң, н•ҷкөҗ л¶Җм Ғмқ‘ мІӯмҶҢл…„л“ӨмқҖ н•ҷкөҗмҷҖ м№ңкө¬л“ӨмқҖ м—¬м „н•ңлҚ° к·ёл“Өл§Ң м ңмҷёлҗңлӢӨлҠ” м җмқҙлӢӨ. к·ёл“Өл§Ң лҸҢлҙ„мқҳ л¶Җмһ¬лҘј кІҪн—ҳн•ҳкі , к·ёл“Өл§Ң мӮ¬нҡҢм Ғ кҙҖкі„л§қмңјлЎңл¶Җн„° кі лҰҪлҗңлӢӨ. мқҙлҹ¬н•ң мң„кё°м—җ л…ём¶ңлҗң м•„мқҙл“Өмқҙ н•ҷкөҗлҘј л– лӮҳкё° м „м—җ л§Ҳм§Җл§ү лҸҷм•„мӨ„лЎң м„ нғқн•ҳлҠ” кІғмқҙ лҢҖм•ҲкөҗмңЎ мң„нғҒкөҗмңЎкё°кҙҖмқҙлӢӨ.
м§ҖлӮң н•ҙ, н•ң н•ҙлҘј н•Ёк»ҳ ліҙлғҲлҚҳ м•„мқҙл“ӨмқҖ мқҙл ҮкІҢ м Җл ҮкІҢ мҶҢмӢқмқ„ л“ЈкІҢ лҗңлӢӨ. к·ё мӨ‘ 2лӘ…мқҳ м№ңкө¬л“ӨмқҖ м§ҖкёҲлҸ„ мқјмЈјмқјмқҙ л©ҖлӢӨ н•ҳкі мҡ°лҰ¬ кіөк°„мқ„ л“ӨлқҪкұ°лҰ°лӢӨ. м•„м§Ғ мғҲлЎңмҡҙ н•ҷкөҗм—җм„ң мҷ„м „нһҲ м Ғмқ‘мқ„ лӘ»н–ҲлӢӨлҠ” лң»мқҙлӢӨ. мғҲлЎңмҡҙ м№ңкө¬л“Өмқ„ мӮ¬к·Җм§Җ лӘ»н–Ҳкұ°лӮҳ м—¬м „нһҲ л§ҲмқҢ л‘ҳ кіімқҙ м—Ҷм–ҙм„ң мһ мӢң мҷҖм„ң мҲҳлӢӨлҘј л–Ёкі к°Җкұ°лӮҳ, л©ҳнҶ м„ мғқлӢҳкіј мӣҗн•ҳлҠ” кіөл¶ҖлҘј н•ҳкё°лҸ„ н•ңлӢӨ. лҳҗ лӢӨлҘё м№ңкө¬лҠ” мӢ¬к°Ғн•ң мӮ¬м•ҲмңјлЎң мқҳлў°лҗҳм—ҲлҚҳ м№ңкө¬мҳҖлҠ”лҚ° мӣҗлһҳ лӢӨлӢҲлҚҳ н•ҷкөҗм—җ л¬ҙмҠЁ мқј мһҲм—Ҳлғҗ мӢ¶кІҢ м Ғмқ‘мқ„ мһҳ н•ҙм„ң м„ мғқлӢҳл“Өмқҳ к°җмӮ¬ мқёмӮ¬к°Җ н•ң нҠёлҹӯмқҙлӢӨ. н•ҷкөҗ лӢӨлӢҲлҠ” лҸҷм•Ҳ л§җ н•ңл§Ҳл”” м—Ҷмқҙ мЎём—…н•ң м№ңкө¬лҠ” м°ё к°җмӮ¬н–Ҳл…ёлқјл©° лӯҗ лҸ„мҡё мқјмқҖ м—ҶлҠҗлғҗкі мқҳм “н•ҳкІҢ 묻기лҸ„ н•ңлӢӨ.
мҡ°лҰ¬к°Җ м•„л¬ҙ мқјлҸ„ мқјм–ҙлӮҳм§Җ м•ҠлҠ”лӢӨкі лҠҗкјҲлҚҳ к·ё лӢөлӢөн•ң мҲңк°„л“Өм—җлҸ„ м•„мқҙл“Өм—җкІҢлҠ” м–ҙл–Ө мқјмқҙ мқјм–ҙлӮҳкі мһҲм—Ҳкі , к·ё мқјл“Ө мҶҚм—җм„ң м•„мқҙл“ӨмқҖ м„ұмһҘн•ҳкі мһҲм—ҲлҚҳ кІғмқҙлӢӨ.
м•„мқҙл“ӨмқҖ мҡ°лҰ¬ мӮ¬нҡҢмқҳ лӘЁмҠөмқ„ к·ёлҢҖлЎң л“ңлҹ¬лӮҙ ліҙм—¬мЈјлҠ” 맑мқҖ кұ°мҡё к°ҷлӢӨ. к·ёлҹ°лҚ° м җм җ лҚ” м•„мқҙл“Өмқҙ л§Һмқҙ м•„н”Ҳ кІғмІҳлҹј лҠҗк»ҙ진лӢӨ. ADHD, мҡ°мҡё, л¶Ҳм•Ҳ, кіөнҷ©, мһҗн•ҙ충лҸҷ л“ұ м•„мқҙл“Өмқҙ ліҙм—¬мЈјлҠ” м •мӢ кұҙк°•мқҳ м§Җн‘ңлҠ” м җм җ лҚ” лӮҳл№ м§ҖлҠ” кІғмІҳлҹј ліҙмқёлӢӨ. кІҢлӢӨк°Җ м•„мқҙл“Ө мӮ¬мқҙм—җм„ң л§Ңм—°н•ң н•ҷкөҗ нҸӯл Ҙ, кұ°мқҳ мқјмЈјмқјмқҙ л©ҖлӢӨ н•ҳкі м—ҙлҰ¬лҠ” н•ҷкөҗнҸӯл Ҙмң„мӣҗнҡҢлҘј ліҙкі мһҲмңјл©ҙ л¬ҙм–ёк°Җ мӨ‘мҡ”н•ң кІғмқҙ лҶ“міҗм§Җкі мһҲлӢӨлҠ” лҠҗлӮҢмқ„ м§Җмҡё мҲҳк°Җ м—ҶлӢӨ.
к°Ғмһҗмқҳ мқҙмң лЎң н•ҷкөҗм—җ м Ғмқ‘н•ҳм§Җ лӘ»н•ҙ лҢҖм•ҲкөҗмңЎ мң„нғҒкөҗмңЎкё°кҙҖмқҙлқјлҠ” мғҲлЎңмҡҙ н•ҷкөҗм—җ мһҗлҰ¬ мһЎмқҖ м•„мқҙл“Өм—җкІҢ мқҙ мһ‘мқҖ н•ҷкөҗлҠ” м–ҙл–Ө кіөк°„мңјлЎң кё°м–өлҗ к№Ң? лҢҖлӢЁн•ң лҢҖм•Ҳмқҙ лҗҳкё° ліҙлӢӨлҠ” к·ёлғҘ м§ҖкёҲмқҳ н•ҷкөҗк°Җ мҲҳн–үн•ҳкі мһҲлҚҳ мҲңкё°лҠҘмқ„ мқҙ мһ‘мқҖ н•ҷкөҗм—җм„ң м•„мқҙл“Өмқҙ л§ҲмқҢк»Ҹ л§ӣліј мҲҳ мһҲкІҢ лҗҳкё°лҘј л°”лһҖлӢӨ. м•Ҳм „н•ҳкІҢ лЁёл¬ј кіікіј м ң л•Ңм—җ лЁ№мқ„ кұ°лҰ¬лҘј м ңкіөн•ҳлҠ” лҸҢлҙ„, м№ңкө¬л“Өкіј м„ мғқлӢҳл“Өкіј н•Ёк»ҳ н•ҳлҠ” кҙҖкі„мқҳ м—°мҠө, мқҙкІғл§Ң н• мҲҳ мһҲм–ҙлҸ„ кҪӨ к·јмӮ¬н•ң н•ҷкөҗлқјлҠ” мғқк°Ғмқҙ л“ лӢӨ. к·ёлҰ¬кі к·ё кіјм •м—җм„ң м„ңлЎңк°Җ м„ңлЎңм—җкІҢ л¬ҙмІҷ мҶҢмӨ‘н•ҳкі мӨ‘мҡ”н•ң мЎҙмһ¬лқјлҠ” кІғмқ„ мЎ°кёҲл§Ң лҚ” м•ҢкІҢ лҗңлӢӨл©ҙ, м •л§җ лҚ”н• лӮҳмң„ м—Ҷмқҙ мўӢмқ„ кІғ к°ҷлӢӨ. м–ҙм©Ңл©ҙ мҡ°лҰ¬мқҳ кҝҲмқҖ мҡ°лҰ¬лҸ„ лӘЁлҘҙлҠ” мӮ¬мқҙм—җ лӮ л§ҲлӢӨ мқҙлЈЁм–ҙм§Җкі мһҲлҠ”м§ҖлҸ„ лӘЁлҘёлӢӨ.
м•Ҳм§Җм„ұ лӘ©мӮ¬/ мғҲн„°көҗнҡҢ